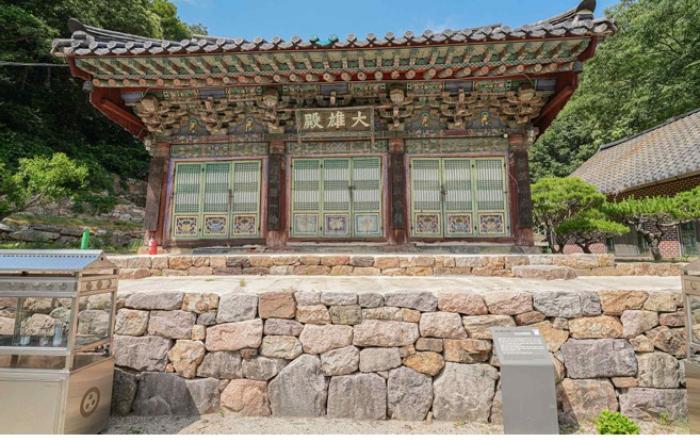탈종교 시대-새 종교와 새 불교의 조건
주류 종교와 불교의 역사는 종교를 배반한 역사이기 일쑤였다. 거의 모든 전쟁에는 종교의 주술이 드리워졌고, 죽임을 부추겼고, 신의 이름으로 영광을 준다고 꼬드겼다. 종교, 불교란 무엇인가. 나는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가 종교와 불교의 속살이라고 생각한다. 한 발 내딛는 자리가 낭떠러지일 줄을 뻔히 알면서도 내디딜 수 있는 무모함의 극치. 그리하여 중생에게 회향됨으로써 비로소 종교와 불교의 꽃이 피어난다.
종교인구 조사 결과, 종교인구가 대폭 줄었다. 종교가 위기라면, 그것은 기성‧기득, 우리 사회의 권력을 누리는 종교의 위기일 것이며, 이는 중생의 위기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귀의처를 떠난 그들은 어디에 귀의처를 마련할까. 상업화 된 명상센터, 신흥종교를 찾아갔을지도 모르겠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좌표로 삼아야겠다고 결심했을 수도 있다.
프로이트(1895-1982)는 종교(기독교)를 부인했고, 극도로 혐오했다. 그는 저작 곳곳에서 반신 반기독교를 역설했다. 이유가 있었다. 어릴 적 겪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그가 무척 따랐던 유모가 있었는데, 성당에 데리고 다니며 어린 프로이트에게 신앙을 경험케 해주었다. 그런 유모가 절도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수치스럽게 쫓겨났다. 프로이트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두 번째 사건은 아버지에게 가해진 반유대적 기독교인들의 폭력이었다. 프로이트가 태어나 오래도록 살았던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반유대 분위기가 지배했다. 유대인들은 길을 양보해야 했다. 아버지는 밀쳐졌고 벗겨진 모자는 길바닥에 나뒹굴었다. 예민한 프로이트에게 이 두 가지 경험은 “신의 존재를 그토록 부정하도록 만든 그의 어린 시절 신 표상이다.”[권수영, 프로이트와 종교, 22p.]
프로이트는 종교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자신은 신(기독교)를 부인하고 혐오했음에도,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갖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물었다. 그 결과 종교에 관한 여러 저작을 남겼다. 그에게 신은 인간이 내면에서 구성해낸 허구적 표상이었으며, “인간이 그의 형상을 따라 하느님을 창조하였다”는 언술로 압축된다. 종교는 또 전쟁의 광기와 분리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 프로이트에게 신은 이성의 퇴행이었다.
이런 프로이트이기에 기독교에서는 마땅히 멀리해야 할 인물이다. 실제 많은 기독교인들은 프로이트를 싫어한다. 그러나 ‘프로이트 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여 프로이트의 반기독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으며, 권수영 연세대 신학대 교수도 그 중 한 사람이다. 프로이트의 비판을 받아들여 풀어야 할 과제로 삼지 않으면 프로이트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프로이트 신학’의 출발점이다.
중생이 떠나니 종교는 위기다. 존립의 근거가 흔들리니 분명 위기를 맞았다. 중생은 종교를 떠나 귀의처를 잃었으니 그 마음이 슬프고 허허롭다. 그들은 할 말을 차마 입 밖으로도 내지 못하고 삼키는, 오늘에도 호모 사케르(Homo Sacer) 혹은 불가촉천민이 있으며,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무엇으로 취급받는 존재가 있다는 것에 사무쳐야 한다. 그들의 표정에서 버리지 못하는 희망을 보아야 하며, 그들의 내지 못한 소리에 담긴 뜻을 찾으려 땅에 귀 기울이는 데서 새 종교와 새 불교는 움틀 수 있을 것이다. 중생이 떠나는 그 자리가 바로 종교가 다시 새 것이 되도록 디뎌야 하는 곳이다.
폭죽이 터졌고, 2017년의 새해를 여는 새 날을 축하했다. 새해를 축하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개체로서의 자기, 그리고 자기가 속한 큰 집단과 작은 동아리, 이런 것들이 자기공동체를 넘어서 자기가 아닌 중생들과 섞이어서 자기 아닌 자기로 뒤바뀌어지는 의식적인 꿈틀거림. 최소한 이런 것들을 불러들여 마음속에서 일렁이게 할 때 비로소 ‘새’날을 맞이하는 것이다. 모두 그런 날을 열었으리라.
기사출처 : 불교포커스 정성운 기자 편집부
<저작권자 ⓒ 한국역사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