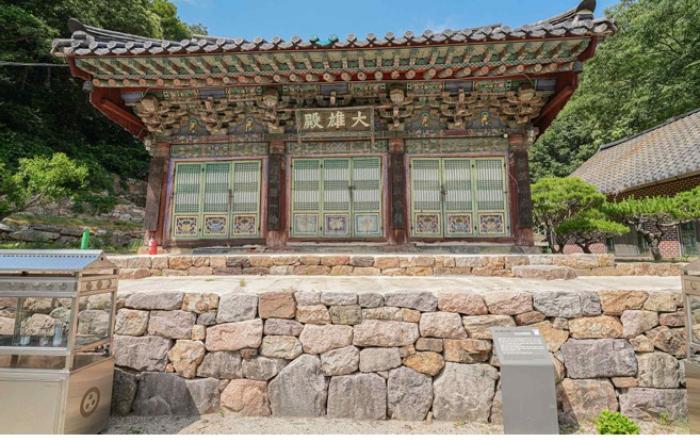100주년 3.1운동이 다가온다. 벌써 백년이 되었기에 3.1운동 백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벌써 시끌벅적한 분위기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야 전국적인 운동이기에 너무 잘알고 있었지만, 당시 외국들의 반응을 알아본다.
[3.1운동에 대한 당사 열강들의 반응-중국/미국/영국]
▶ 중국
중국 신문들은 3·1운동이 발발하자 이 독립운동의 진전상황을 크게 보도하였습니다.
상해에서 발간되던 孫文 계통의≪國民日報≫는 1919년 3월 12일부터 상해에서 5·4운동이 발발하던 5월 7일 하루 전까지 한국의 3·1운동 상황을 20회 이상 보도하였습니다.
북경의 영자신문≪북경데일리뉴스(Peking Daily News)≫도 거의 매일같이 3·1운동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5·4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북경의 시사주간지≪每週評論≫은 중국의 신문화운동의 기수인 陳獨秀와 李大釗가 편집인으로 있었는데 제13호와 제14호에 한국의 3·1운동에 대해 해설기사를 싣고 중국 국민들이 반일제·반매국노 투쟁에 궐기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런 언론의 보도는 북경 대학생들에게 깊은 자극을 주었습니다. 북경 대학생들의 잡지≪新潮≫도 1919년 4월 1일자에 한국독립운동에 관한 2편의 논문을 게재하며 3·1운동을 본받아 중국 국민들도 궐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잡지에 기고하였고 후에 5·4운동의 학생대표로 활동했던 傅斯年은<한국독립운동중의 신교훈>이란 글에서 3·1운동은 정신면에서 “혁명계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하였습니다.
북경대학 학생구국회의 월간잡지≪國民≫, 1919년 4월호에도 한국의 3·1운동을 특집으로 4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북경대학 구국학생회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5월 2일≪국민≫편집실에서 5·4운동을 위한 시위운동을 결의하고, 천안문 광장에서 시위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상해에서도 5월 7일 중국의 국치기념일에 약 2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약 30명의 한인청년독립단 청년들이 참가하여 반일문서를 돌리며 시위운동에 참가하였습니다.
▶ 미국
미국 정부는 한국민족과 한국의 독립운동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은 미국 여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는 3월 20일부터 한국의 독립운동과 인권상황에 대해 다루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연합통신(UP)은 1919년 3월부터 1920년 12월 15일 사이에 한국에 관한 기사를 9,000회나 다루었습니다.
이 중 일본에 유리한 기사는 50가지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여론은 일본의 잔인성과 만주침략까지 야욕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서재필은 자유한인대회와 한국친우회를 조직하여 미국 사회에 한국에 대한 동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기에 힘썼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미국 의회에서 한국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19년 6월 30일 미조리(Missouri)州 센트루이스(St. Louis) 출신의 상원의원인 스펜서(Spencer)는 국무장관에게 1882년의<한미수호통상조약>의 이행 필요성을 외교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1919년 7월 15일 국제연맹 비준문제를 다루던 상원에서 포인덱스터(Pointexter) 의원은 국제연맹이 표방하는 이상주의에 반하는 예로써 한국문제를 거론하며 일본의 지배 아래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잔인성과 폭력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을 가리키며 윌슨 대통령의 헌장의 무의미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네브라스카 출신의 노리스(Norris) 의원은 한국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당하고 있는 참혹한 현실에 관한 사진을 공개하며 일본 당국의 잔혹성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7월 13일자에 최소한 30명이 학살된 제암리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
4월 중순 한국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미국에 온 암스트롱(A. E. Armstrong) 목사는 미국 장로교 선교부 서기 아더 제이 브라운(Arther J. Brown), 미국 감리교 복음교회 선교부 서기 프랭크 메이슨 노드(Frank Mason North), 미국성서회 서기 윌리암 제이 헤븐(William J, Heven) 박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4월 16일 교회연합회 동양관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한국으로부터 30명 이상의 믿을 만한 선교사, 외국인들의 보고서를 이용하여 한국에서의 잔학행위에 대한 보고서로≪한일사태(The Japan-Korea Situation)≫를 통해 일본의 식민지 체제, 한국 독립운동의 기원, 한국인의 항거와 경찰의 포악 등과 함께 34개의 일제 잔학상을 폭로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의회내에서 한국문제에 대한 동정적인 논의가 몇 차례 있었지만 미 행정부에 준 영향은 별로 없었다. 일부 의원들은 국제연맹 비준에 대한 반대자료로 한국의 상황을 활용하였습니다.
▶ 영국
영국은 동경 주재 영국대사관으로부터 4월 24일 공식적으로 3·1운동에 대해 보고를 받자 식민주의의 본산답게 자국과 그 식민지 출신의 거류민 보호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지시하면서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심이나 동정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의 한국인들이 영국에 대해 4월에 조직된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자 “한국은 1910년 일본에 합병되었으며 따라서 이번 반란은 일본 국내문제로서 의심할 나위 없이 쉽사리 진압될 것이다”고 하며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영국은 한국사태를 구실로 일본이 만주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표출시킬 것을 우려하여 북경주재 영국공사 존 죠단(John Jordan)에게 만주에서 활동중인 한국 독립군의 무장을 해제하도록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주재 영국 대리총영사 윌리암 엠 로이즈(William M. Royds)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정책과 시위운동의 진압방법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갖고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에 호의를 보였습니다.
그는 본국에 보내는 보고서에서 한국인들이 자치역량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동경 주재 대리대사 비일비 엘스톤(Beilby Alston)도 3·1운동에 대한 일본의 정책에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들은 영국 외무성의 정책을 바꾸게 하지는 못했다. 영국은 영일동맹관계를 더 중시하여 한국사태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제암리 학살사건의 발발은 세계 문명국가의 주의를 환기시켰지만 영국은 다만 한반도에서 일본의 극단적인 가혹성을 완화하여 일본의 지배권을 약화시킴이 없이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영국은 이집트나 인도에서와 같이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 한국문제의 해결로 보았습니다.
1918년 8월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이 부임하자 외무성 관리들은 한국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로 만족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기사출처 : 이경덕 선생
<저작권자 ⓒ 한국역사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