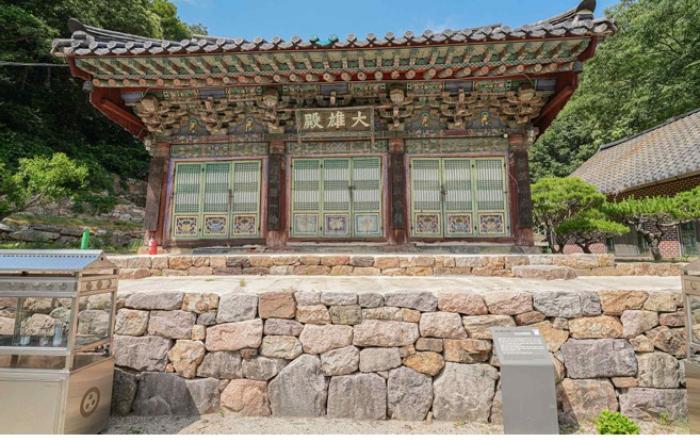答田父(답전보)
정도전(鄭道傳)의 삼봉집(三峰集) 3권 中

정도전은 고려 말기 공민왕이 죽고 우왕이 등극한 1374년, 권력 실세인 이인임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33세 나이에 전라도 나주목의 거평 부곡으로 귀양을 간다. 천역(賤役)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였다.
농민들의 예리한 세태 풍자를 담은 ‘농부에게 답하다(答田父)’는 바로 이때 남긴 글이다. “밭에서 손에 호미를 들고 김을 매는”한 늙은 농부가 정도전의 죄목을 추측해 가는 형식을 빌려 조정 벼슬아치들의 비뚤어진 삶을 통렬히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다.
寓舍卑側隘陋(우사비측애루) 어느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낮고 기울고, 좁고 더러워서
心志鬱陶(심지울도) 마음이 답답하였다.
一日出遊於野(일일출유어야) 하루는 들에 나가 노닐다가
見一田父(견일전부) 농부 한 사람을 보았는데,
厖眉皓首(방미호수) 눈썹이 기다랗고 머리가 희고
泥塗霑背(니도점배) 등에 진흙이 묻었으며,
手鋤而耘(수서이운) 손에는 호미를 들고 김을 매고 있었다.
予立其側曰(여립기측왈) 내가 그 옆에 다가서서 말하기를,
父勞矣(부노의) “노인장 수고하십니다.”라고 말하였다.
田父久而後視之(전부구이후시지) 농부는 한참 후 나를 돌아보더니
置鋤田中(치서전중) 호미를 밭이랑에 두고는
行原以上(행원이상) 언덕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와
兩手據膝而坐(양수거슬이좌) 두 손을 무릎에 얹고 앉으며
頤予而進之(이여이진지) 턱을 끄덕이어 나를 오라고 했다.
予以其老也(여이기노야) 나는 그가 노인이었기 때문에
趨進拱立(추진공립) 그 앞에 걸어가 공손히 섰다.
田父問曰(전부문왈) 농부가 나에게 묻기를,
子何如人也(자하여인야) “그대는 어떠한 사람인가?
子之服雖敝(자지복수폐) 그대의 의복이 비록 해지기는 하였으나
長裾博袖(장거박수) 옷자락이 길고 소매가 넓으며
行止徐徐(행지서서) 행동거지가 의젓한 것을 보니
其儒者歟(기유자여) 혹 선비가 아닌가?
手足不胼胝(수족부변지) 수족에 굳은살이 없고
豐頰皤腹(풍협파복) 뺨이 풍요하고 배가 불룩하게 나온 것을 보니
其朝士歟(기조사여) 조정의 벼슬아치가 아닌가?
何故至於斯(하고지어사) 무슨 일로 여긴 왔는가?
吾老人(오노인) 나는 노인이며
生於此老於此(생어차노어차) 여기서 나서 여기서 늙었기 때문에,
荒絶之野(황절지야) 거친 들과
窮僻瘴癘之鄕(궁벽장려지향) 장기(瘴氣)로 전염병이 가득 찬 궁벽한 시골에서
魑魅之與處(리매지여처) 도깨비와 더불어 살고
魚鰕之與居(어하지여거) 물고기 새우와 더불어 사는 처지가 되었지만,
朝士非得罪放逐者不至(조사비득죄방축자부지) 조정의 벼슬아치라면 죄를 짓고 추방된 사람이 아니면 이곳에는 오지 않는데,
子其負罪者歟(자기부죄자여) 그대는 죄를 지은 사람인가?”라고 말하였다.
曰然(왈연) 내가 답하기를 “그러합니다.”하니
曰何罪也(왈하죄야) 그가 나에게 묻기를 “무슨 죄인가?
豈以口腹之奉(기이구복지봉) 어찌 너의 입과 배를 채우고
妻子之養(처자지양) 네 처자식만을 먹여 살리기 위해
車馬宮室之故(차마궁실지고) 좋은 마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자 하여
不顧不義(부고불의) 불의(不義)를 돌아보지 않고서
貪欲無厭鎰罪歟(탐욕무엽일죄여) 한없이 욕심을 채우려다가 죄를 얻은 것인가?
抑銳意仕進(억예의사진) 아니면 벼슬을 꼭 해야겠는데
無由自致(무유자치) 스스로는 이룰 길이 없어서
近權附勢(근권부세) 권신을 가까이하고, 세도에 붙어
奔走於車塵馬足之間(분주어거진마족지간) 수레먼지와 말발굽 사이에 분주하면서
仰哺於殘杯冷炙之餘(앙포어잔배냉적지여) 남은 술과 식은 고기 조각이나 얻어먹으려고
聳肩謟笑(용견첨소) 어깨를 움츠리고 아첨을 떨며
苟容取悅(구용취열) 구차한 모습으로 기쁨을 얻어
一資或得(일자혹득) 어쩌다가 한 자급(資級 벼슬)을 얻었다가
衆皆含怒(중개함노) 여러 사람이 모두 화를 내니
一朝勢去(일조세거) 하루아침에 형세가 가버려서
竟以此得罪歟(경이차득죄여) 결국 이렇게 죄를 얻게 된 것인가?”라고 말하였다.
曰否(왈부) 내가 답하기를 “그런 게 아닙니다.”하니
然則豈端言正色(연칙개단언정색) “그러면 어찌 단정한 말과 바른 얼굴로
外示謙一本作廉(외시겸일본작염) 겉으로 겸손해 보이게 하고 청렴한 체하여
退盜竊虛名(퇴도절허명) 물러나서는 헛된 이름을 훔치고는
昏夜奔走(혼야분주) 어두운 밤에는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作飛鳥依人之態(작비조의인지태) 사람에 기댄 나는 새 모습을 흉내 내어
乞哀求憐(걸애구련) 애걸하고, 가엾게 보여
曲邀橫結(곡요횡결) 바르지 못한 것을 맞이하여 종횡으로 결탁하여
釣取祿位(조취록위) 녹위(祿位)를 낚아서
或有官守(혹유관수) 혹여 관수(官守)에 있거나
或居言責(혹거언책) 혹여 언책(言責)을 맡거나 하여
徒食其祿(도식기록) 헛되이 녹만을 먹고
不思其職(부사기직) 그 직책은 돌아보지 않으며,
視國家之安危(시국가지안위) _ 국가의 안위를 돌보는 것과
生民之休戚(생민지휴척) 생민(生民)의 안락과 근심,
時政之得失(시정지득실) 시정(時政)의 득실,
風俗之美惡(풍속지미악) 풍속의 미악(美惡)등은
漠然不以爲意(막연부이위의) 막연히 뜻을 두지 않아
如秦人視越人之肥瘠(여진인시월인지비척) 진(秦)나라 사람이 월(越)나라 사람이
살찌든 여위든 관심없이 보듯이
以全軀保妻子之計(이전구보처자지계) 자기 몸만 온전히 하고 처자를 보호하는 계책으로
偸延歲月(투연세월) 세월만 훔치다가
如見忠義之士不顧身慮(여견충의지사부고신려) 만일 충의지사(忠義之士)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以赴公家之急(이부공가지급) 국가의 급한 일에 나아가
守職敢言直道取禍(수직감언직도취화) 직분을 지키고 바른길을 말하다가,
화를 당하게 된 것을 보면,
則內忌其名(즉내기기명) 안으로는 그 이름을 시기하고
外幸其敗(외행기패) 밖으로는 그 패한 것을 다행으로 여겨
誹謗侮笑(비방모소) 그를 비방하고 비웃으며
自以爲得計(자이위득계) 스스로 계책을 얻은 듯 여기다가
然公論諠騰(연공론훤등) 공론이 비등하고
天道顯明(천도현명) 하늘의 뜻이 밝혀져
詐窮罪覺以至此乎(사궁죄각이지차호) 거짓이 궁하고 죄가 발각되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인가?”하고 말하였다.
曰否(왈부) 내가 답하기를 “그것도 아닙니다.” 하니
然則豈爲將爲帥(연즉개위장위수) “그렇다면, 장수가 되어서
廣樹黨與(광수당여) 널리 당파를 같이 세워서
前驅後擁(전구후옹) 앞에서 몰고 뒤에서 옹위하며,
在平居無事之時(재평거무사지시) 평화로이 아무 일도 없을 때에는
大言恐喝(대언공갈) 큰 소리로 공갈을 쳐서,
希望寵錫(희망총석) 왕의 총애를 받아
官祿爵賞(관록작상) 관록(官祿)과 작상(爵賞)을 뜻대로 이루어
惟意所恣(유의소자) 오직 방자한 마음으로
志滿氣盛(지만기성) 의지가 가득차고 기운이 성하여
輕侮朝士(경모조사) 조정의 선비(朝士)들을 경멸하다가,
及至見敵(급지견적) 급기야 적군을 만나
虎皮雖蔚(호피수울) 호랑이 가죽 휘장은 아름답지만
羊質易慄(양질역율) 본질이 양이라 겁을 잘 내어,
不待交兵(부대교병) 교전을 하지 않고
望風先走(망풍선주) 적의 풍진(風塵)만 보아도 먼저 달아나
棄生靈於鋒刃(기생령어봉인) 생령(生靈) 마저 적의 칼날에 버리고
誤國家之大事(오국가지대사) 국가의 대사를 그르치기라도 하였는가?
否則豈爲卿爲相(부즉기위경위상) 아니면, 어찌 경상(卿相)이 되어서
狼愎自用(낭퍅자용) 이리처럼 괴팍한 성질을 부리고
不恤人言(부휼인언) 남의 말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며
佞己者悅之(녕기자열지) 자기에게 아첨하는 이는 기뻐하고
附己者進之(부기자진지) 자기에게 아부하는 자는 기꺼이 들어 쓰며
直士抗言則怒(직사항언즉노) 곧은 선비가 말을 거스르면 성을 내고,
正士守道則排(정사수도즉배) 바른 선비가 도를 지키면 배격하며
竊君上之爵祿爲己私惠(절군상지작록위기사혜) 임금의 爵祿을 훔쳐 자기의 사사 은혜로 만들고,
弄國家之刑典爲己私用(농국가지형전위기사용) 국가의 刑典을 농단하여 자기의 사용으로 삼다가
惡稔而禍至(악임이화지) 악행이 여물어 화가 이르러
坐此得罪歟(좌차득죄여) 마침내 이러한 죄에 걸린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曰否(왈부) 내가 답하기를 “그것도 아닙니다.”고 하니
然則吾子之罪(연즉오자지죄) “그렇다면 그대의 죄목을
我知之矣(아지지의) 나는 알겠도다.
不量其力之不足而好大言(불량기력지부족이호대언) 그 힘의 부족한 것을 헤아리지 않고 큰소리를 좋아하고,
不知其時之不可而好直言(부지기시지부가이호직언) 그 시기의 불가함을 알지 못하고 바른말을 좋아하며,
生乎今而慕乎古(생호금이모호고) 지금의 세상에 태어나서 옛사람을 사모하고
處乎下而拂乎上(처호하이불호상) 아래에 처하였으면서도 위를 거스른 것이
此豈得罪之由歟(차기득죄지유여) 바로 죄를 얻은 원인이로다.
昔賈誼好大(석가의호대) 옛날 가의(賈誼 중국 전한의 문인)가 큰소리를 좋아하고,
屈原好直(굴원호직) 굴원(屈原 중국 초나라의 정치가)이 곧은 말을 좋아하고,
韓愈好古(한유호고) 한유(韓愈 중국 당나라의 문인)가 옛 것을 좋아하고,
關龍逢好拂上(관룡봉호불상) 관용봉(關龍逢)이 윗사람에게 거스르기를 좋아했다.
此四子皆有道之士(차사자개유도지사) 이 네 사람은 다 도(道)가 있는 선비였는데도
或貶或死(혹폄혹사) 혹은 관직을 빼앗기고 혹은 죽어서
不能自保(부능자보) 스스로 자기 몸을 보전하지 못하였거늘,
今子以一身犯數忌(금자이일신범수기) 그대는 한 몸으로서 몇 가지 금기(禁忌)를 범하였는데
僅得竄逐(근득찬축) 겨우 귀양에만 처해지고
以全首領(이전수령) 목숨은 보전하게 하였으니,
吾雖野人(오수야인) 나 같은 촌사람이라도
可知國家之典寬也(가지국가지전관야) 국가의 법이 너그러움을 알 수가 있도다.
子自今其戒之(자자금기계지) 그대는 지금부터라도 조심하면
庶乎免矣(서호면의) 거의 화를 면하게 될 것이오.”하였다.
予聞其言(여문기언) 나는 그 말을 듣고서
知其爲有道之士(지기위유도지사) 그가 도가 있는 선비임을 알았다.
請曰(청왈) 그리하여 내가 노인에게 청하기를,
父隱君子也(부은군자야) “노인장께서는 은군자(隱君子)이십니다.
願館而受業焉(원관이수업언) 객관(客館)에 모시고 배우고자 합니다.”하니,
父曰(부왈) 노인이 말하기를,
予世農也(여세농야) “나는 대대로 농사짓는 사람이오.
耕田輪公家之租(경전륜공가지조) 밭을 갈아서 국가에 세금을 내고
餘以養妻子(여이양처자) 남은 것으로 처자를 양육하니
過此以往(과차이왕) 이 밖의 것은
非予之所知也(비여지소지야) 나의 알 바가 아니오.
子去矣(자거의) 그대는 물러가시오
毋亂我(무란아) 나를 어지럽히지 마시고.”
遂不復言(수부부언) 하고서는 다시 말하지 않았다.
予退而歎之(여퇴이탄지) 나는 물러나와 탄식하기를
若父者(약부자) ‘저 노인은 옛날의 은자로서
其沮溺之流乎(기저익지류호) 장저(長沮)와 걸익(桀溺) 같은 사람
(공자의 周流天下를 기롱하였던 두 사람)이구나.’고 말하였다.
자료참고. 조수불가여동군(鳥獸不可與同群, 鸟兽不可与同群)
장저(長沮)와 걸익(桀溺) 같은 사람 (공자의 周流天下를 기롱하였던 두 사람)
장저(長沮)와 걸익(桀溺)이 나란히 밭을 갈고 있었는데 공자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자로(子路)로 하여금 나루터를 물어보게 하셨다.
장저가 말했다. “저기 수레를 잡고 있는 자는 누구요?”
자로가 말했다. “공구(孔丘)라는 분입니다.”
장저가 말했다. “저 자가 노나라의 공구란 말이오?”
자로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장저가 말했다. “저 자는 나루터를 알고 있소.”
걸익에게 물으니 걸익이 말했다. “당신은 누구요?”
자로가 말했다. “중유(仲由)라 합니다.”
걸익이 말했다. “그러면 노나라 공구의 문도(門徒)요?”
자로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걸익이 말했다. “도도히 흐르는 물처럼 천하가 다 이러하니 누가 그 흐름을 바꾸겠소?
당신도 사람을 피하는 선비를 따르기보다 차라리 세상을 피하는 선비를 따르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고무래질을 그치지 않았다. 자로가 가서 있었던 일을 고하니 선생님께서 쓸쓸히 말씀하셨다.
“새나 짐승과는 함께 무리지어 살 수 없느니 내가 이 사람들 속에 섞여 살지 않는다면 무엇과 함께 살겠느냐? 천하에 도가 있다면 나도 굳이 바꾸려 들지 않을 것이다.”
長沮桀溺耦而耕,孔子過之,使子路問津焉.長沮曰;夫執輿者爲誰子路曰;爲孔丘.曰;是魯孔丘與?曰;是也.曰;是知津矣.問於桀溺.桀溺曰;子爲誰曰;爲仲由.曰;是魯孔丘之徒與?對曰;然.曰;滔滔者天下皆是也.而誰以易之且而與其從辟人之士也,豈若從辟世之士哉耰而不輟.子路行以告.夫子憮然曰;鳥獸不可與同群,吾非斯人之徒與而誰與?天下有道,丘不與易也.
이 이야기는 《논어(論語) 〈미자(微子)〉》에 나오며, 《사기(史記) 〈공자세가(孔子世家)〉》에도 실려 있다. 공자는 장저나 걸익처럼 자신의 깨끗함만을 추구하는 은자의 길을 택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도가 행해지는 사회를 꿈꾸었던 것이다. 여기서 유래하여 ‘조수불가여동군’은 사람이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을 비유하거나,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은 선비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장저(長沮)와 걸익(桀溺)은 은인일사(隱人逸士)의 한 유형으로 공자와 연관하여 창조된 인물로 보인다. 따라서 논어에 등장하는 초광접여(楚狂接輿)처럼 유가적 인간상을 바야흐로 넘어서는 새로운 인간 유형이기 때문에 전국시대의 막다른 상황에서 그 시대를 헤쳐나갈 도피적 가치관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유시문 기자
<저작권자 ⓒ 한국역사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