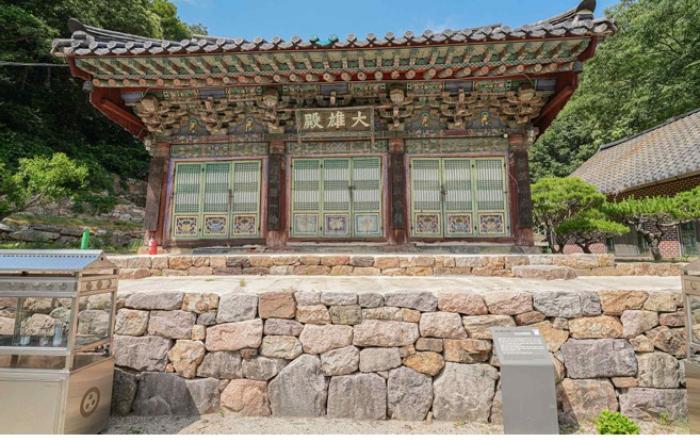불법을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정신으로 살았던 실천하는 불교인
법화경을 홍포했다고 문책을 당한 것은 내가 법화경을 확고히 믿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달은 기울어야 차고 바다는 썰물 뒤 만조가 됩니다. 머지 않아 옳고 그름이 분명히 드러나겠지요. 이 어찌 한탄할 일이겠습니까.
무사시현 군수에게 끌려가 13일 가마쿠라를 거쳐 사도 땅에 유배됐습니다. 지금은 혼마에 갇혀있고 앞으로도 4∼5일은 더 이곳에 머무를 것 같습니다.
그대의 슬픔과 안타까움이야 더할 나위 없겠지만 내 자신은 처음부터 이렇게 될 것을 각오하고 있었기에 결코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참수되지 않은 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던 바가 아닙니다. 법화경을 위해 과거에 목이 베어졌다면 이런 하찮은 처지에 머무르는 신세도 되지 않았겠지요. 법화경에는 말법시대에 이 경전을 널리 전하려는 자는 그 때문에 추방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죄를 소멸하고 마침내 성불하게 되는지라 지금의 난관들은 오히려 크게 경사로운 일인 것입니다.
일본불교사의 한 획을 그은 니치렌(日蓮, 1222∼1282) 스님. 일련정종(日蓮正宗)의 개조인 스님은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던 때인 1271년 9월 12일 독실한 신도였던 토키조닌(富木常忍) 씨에게 편지를 보냈다. 법화경의 가르침을 펴다가 기성종교와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혀 언제 참수형을 당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스님을 뒤따르던 수많은 신도들은 당황했으나 스님은 태연했다. 오히려 편지를 통해 스님은 자신이 체포된 경위와 법난에 의해 숙세에 지은 악업이 소멸되는 것이라고 지도하고 있다. 또 법화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강조하고 자신을 위해 근심하지 말 것도 함께 당부하고 있다.
니치렌 스님은 일본불교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산 인물로, 1222년 2월 일본 나가사군 도죠지방의 바닷가 마을인 고미나토에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보내야 했던 스님은 12세 때 천태종의 명찰인 세이초사(淸澄寺)에 맡겨져 불교를 공부, 16세 때 정식 스님이 됐다. 이후 가마쿠라, 히에이산 등 여러 지역에서 진언종과 선, 정토종의 교리를 배운 후 자신의 사색과 체험을 통해 법화경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불교를 선언하고 마침내 1253년 개종(開宗)을 선언했다.
스님은 법화경지상주의적인 사상을 통해 개인의 구제뿐 아니라 사회·국가의 전체적인 구제라는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받는 만큼 기존의 승단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스님은 “염불은 무간지옥(念佛無間)의 길이고 선은 천마의 길이며(禪天魔), 진언은 나라를 망치고(眞言亡國), 계율의 나라의 도적(律國賊)”이라 하여 모든 불교를 철저히 배격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수행과 해탈이라는 불교의 목적대신 권력에 영합하는 기존의 불교계에 대한 경고였다.
이러한 그의 언행은 곧바로 여타 불교종파와 막부의 강력한 반발을 샀고 긴 고난의 세월을 걷게 된다. 더욱이 사람들이 법화신앙으로 회귀하지 않는다면 내란이나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임을 거듭된 유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1268년 때마침 몽고의 일본정벌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스님은 요주의 인물이 되었다. 그리고 결국 1271년 사회를 어지럽혔다는 죄목으로 참수의 명령이 떨어지지만 불가사의하게도 커다란 광채가 출현하는 바람에 살 수 있었다고 전한다.
어쨌든 위의 편지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스님은 1282년 61세의 나이로 입적하기까지 법을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정신으로 살았던 실천하는 불교인이었다.
그러나 ‘회통불교’를 강조하는 한국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 연유야 어쨌든 니치렌 스님의 독선적인 주장과 행동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정법수호를 위해 생명을 초개와 같이 버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후대 불교인들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현재 스님의 편지는 일본 릿쇼대에서 펴낸 『昭和定本日蓮聖人遺文』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역사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