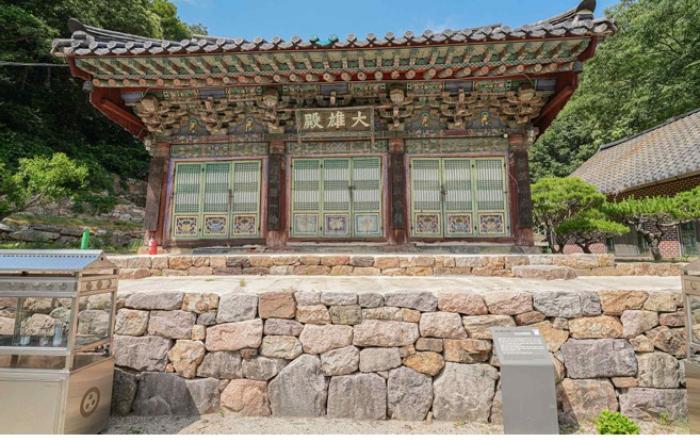한의학의 이해
병명이 붙여지기까지 무엇이 원인인가 밝혀 치료하는 학문
동양의 자연관(自然觀)에 따르면 우주만물은 자연(自然)의 섭리속에서 존재하며 자연(自然)의 질서(자전=밤, 낮, 공전=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운행(運行)한다. 인간은 자연(自然)의 일부로서 자연(自然)의 질서(秩序)에 따라 살고있다.(사계절, 밤과낮, 육기=풍(風), 한(寒), 서(暑), 습(濕), 조(燥), 화(火)). 따라서 인체에 질병이 발생하는 까닭과 그 치료 방법은 자연(自然)의 섭리와 질서에 바탕을 두게 된다. 동양의학은 이러한 자연관(自然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연 = 스스로 그러한 것)
한의학이란 표현을 사용한지는 불과 100년(?)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현대 중국에서는 중의학, 북한에서는 동의학(東醫學), 한국에서는 한의학(韓醫學), 일본에서도 한의학(漢醫學)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특별한 명칭이 없으며 그냥 의학이며 의원으로 칭하였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한의학(漢醫學)의 역사와 한의학(漢醫學)이란 이름으로 선조(先祖)들이 칭(稱)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역사적인 증거로는 은대(殷代 BC1766~1112)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갑골문자(甲骨文字)로 疾年(질병이 돌았던 해), 雨疾(장마철에 돌았던 질병), 降疾(하늘에서 내린 질병) 등으로 일종의 전염병이 기록된 것을 찾아 볼 수 있으며 현대한의학에서 溫病學이라는 부분으로 연구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이 고대의학(古代醫學)의 始發된 기록의 처음이 아닌가 생각되어 진다.
 (민제한의원장·24체질연구소장)
(민제한의원장·24체질연구소장)
그 이후 한의학(漢醫學)의 최고(最古) 고전인 황제내경(秦, 漢시대)에 宇宙의 이치에 대한 기본이론인 운기론(運氣論), 맥법, 침구법, 양생법, 약물 사용에 대한 기본이론(氣味論), 四診法(望,聞,問,切)이 기술되어 있으며 황제내경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연구된 명의 편작의 난경을 시작으로.
漢代 장중경의 상한론(고방-상한방, 금궤방)
후세방ㅡ金, 元詩代ㅡ왕숙화의 맥경, 金, 元 四大家(補土派, 補水派)이후 조선 말기까지의 한의학 (허준 동의보감)
조선중기 이후의 사암도인 침법(=오행침법),
조선말기-이제마선생의 사상의학,
현대 권도원선생의 8체질침법,
체질의학의 완성인 염태환 박사의 24체질의학
등이 있다.
한의학의 기본 이론은 음양오행
한의학의 기본 이론은 음양오행이며 음양오행은 곧 우주변화의 이치를 古代 선조들이 발견하게 됨으로써 기본 이론으로 확립됨에 그 토대 위에 한의학이 발전 계승되어왔다. 여기에서 한의학이라 칭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의학의 漢字는 옥편에 나라 이름 한(한나라 漢), 클 漢(千字文) 等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그 본뜻은 天河雲, 즉 은하수를 뜻하며 곧 우주를 뜻함이니 바로 음양오행의 이론이기 때문이다.
한의학의 범주에 크게는 약물학, 침구학, 무학(무술-태극권,도인법, 기공 건신술) 즉 양생법(호흡법, 운동법)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의학은 음양오행의(우주변화) 토대 위에 수많은 이론적 노력과 실제적 경험 속에서 계승 발전된 우수한 의학이나 안타깝게도 현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은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먼저 간 후 한의원에는 삐거나 근육통(신경통), 체한데 등에 침이나 맞을까? 보약이나 먹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어떤 질병이나 질환이 생겼을 때 한의원에서 치료해 보려는 인식이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병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인 줄 알지 한의원에서 무슨 병을 고칠 수 있을까 하며 그저 간단한 것이나 치료하겠지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양의사들이 한약 먹으면 간 나빠진다, 신부전증에 한약 먹으면 큰일 난다는 등등 자기 학문만 옳고 남의 학문에 대하여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무조건 틀렸다고 하니 웬 아집이란 말인가.
한의학의 특성은 무엇인가? 치병(治病)에 필구어본(必求於本)이라 즉 병명이 붙여지기까지 무엇이 원인이 되었는가를 밝혀서 치료하는 학문이다.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프면 아픈 결과를 진통제로 그때그때의 통증만을 사라지게 하고 다시 아프면 또 진통제? 하는 식의 치료는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닌 것이다. 두통의 원인은 거의 다 첫째 위장장애와 기체(칠정상=스트레스), 둘째 수분대사장애(痰飮), 셋째 혈중노폐물(어혈) 등이 원인이 되며 첫째, 둘째, 셋째 의 원인은 체질적 불균형으로부터 기인되는 것이니 원인치료 근본치료는 체질적 치료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치료해야만이 재발이 없는 올바른 치료가 아니겠는가?
비하되는 우리의 학문과 기술, 예술
자기나라 것은 싫고 서양 것은 무조건 옳고 좋단 말인가? 선조들의 귀중한 것에 왜 그리 무심한지 모르겠다. 예를 들면 도자기의 장인들은 옹기쟁이,(선조들이 사용했던 유약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침놓으면 침쟁이, 사주학도는 사주쟁이(점쟁이), 학문을 해도 쟁이, 기술이 출중해도 쟁이, 예술성이 뛰어나도 쟁이......, 귀중한 것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후회해 본들 안타까울 뿐이다. 급기야는 한의학 배우러 미국에 유학갈까 독일로 유학갈까 한의학도로서 안타깝고 애석하기 그지없다.
개인적으로 많은 임상경험에서 실로 탁월한 효과를 경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종양질환(경부임파선종양, 자궁근종, 폴립, 암(?), 갑상선 질환, 백혈병(혈소판감소증) 등과 응급성 질환(격심한 두통, 가성콜레라, 고열, 격심한 어지러움, 격심한 복통, 격심한 월경통, 급성염증성 질환-급성중이염, 급성축농증, 急性 기관지염, 급성장염, 신부전증초기, 간경화초기, 당뇨병, 괴사성 염증(당뇨 등 만성질환후유증으로 인한 괴사성 염증, 다발성 종기 증후군))ㅡ수술을 요하거나 심지어 절단을 요하는 질환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아왔다.
일본에서는 재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 비록 古方과 後世方 일부이지만 괄목할 만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한약은 먹으면 천천히 효과 본다(보약의 효과는 차츰 변화가 온다. 그래도 보통 복용 중에 늦어도 2주일 안에 변화를 느낀다.), 한약은 효과가 복용한 후 몇 달 후에 나타난다는 등 실로 어이없는 국민들의 인식으로 이 땅에 한의학은 몰락해 가고 있다.(밥 먹고 바로 배부르지 며칠 있다가 배부른가?ㅡ약물이 넘어가자마자 신효할세라.)
일본은 1600년부터 古方이 연구되어왔는데 1700년도의 명의 길익동동(吉益洞東)은 평생에 신념이 ‘若藥 不暝眩이면 厥疾不療’라 하는 의지로(약을 복용하자마자 곧바로 증상들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처방이 부실하거나 틀린것이며 병은 치료되지 않는 것이다) 古方을 반석위에 올려놓았다. 이러한 귀중한 노력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들은 부단히 노력해 왔다.
중국의 경우 문화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기라성 같은 임상고수들이 죽음으로서 한방의학의 맥이 많이 끊어진 상태이며 우리 나라는 독특한 민족성에 의해 고방과 24체질침, 24체질방(염태환 선생님), 한의학의 전 부분(무위당 이원세 선생님, 2001년, 98세 작고), 사암침법(金烏 김홍경 선생님이 연구 보급)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 왔으며 조선중기 이후에 사암도인의 오행침법은 역대 어떤 명의들도 생각하지 못한 위대한 발견이며 조선말기 이제마선생의 四象醫學 또한 엄청난 업적이 아닐 수 없다.
허나 고방 또한 위대한 방법이나 한의학의 전부가 아니며 후세방과 사상의학 또한 한의학의 전부가 아니다. 분명히 그것은 근간을 이룰 중요한 발견이나 얽매여서는 안 된다 즉 한의학을 연구하는 학도들은 모두 다 숙지하여야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옛날에도 환자를 진료하여 처방할 때도 어렴풋이 체질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마 선생님이 체질의학을 깊이 연구 기록하여 후학들에게 전하는 바 임상에 굉장히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나 그 또한 얽매여서는 안 된다. 불교적으로 볼 때 지월(指月)의 논리랄까?
‘손을 들어 중천에 떠가는 달을 가리켰다. 보라 하던 달은 온데 간데 없고 손목만이 후세에 남았다. 이 손목을 비단 보자기에 싸 제단 위에 모셨다. 예루살렘의 성직자와 바리새인들이 등에 업고 다니던 모세의 율법은 바로 그 제단 위에 손목이다. 모두 성당에 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무작정 절을 하란다. 손이나 손가락을 가운데 놓고 1등가는 학자들이 연구와 토론으로 세월을 보낸다 해도 그 속에서는 둥근 달이 돋아나지 않는다. 법당에 다극한 경전의 내용들이 아무리 호탕하고 도도한 것이로서니 일찍이 저 달을 보라고 중천을 가리켰던 손가락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는 것이 선가에서 말하는 指月의 논리이다. 옛 성현들이 치료함에 있어 어떠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모습을 어떻게 전한단 말인가? 하는 수 없이 글로 전했을 뿐인데 그 글에 얽매여 모습은 보지 못하니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 잘라다가 연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말이다.’ ㅡ서여 민영규 선생님 말씀 중에서ㅡ
최근에 체질에 대한 연구가 널리 연구되고 깊이 연구되어 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나 개인적으로 볼 때 전체성을 잃고 부분에 집착함이 또한 안타깝다. 예를 들어 먹거리에 대한 연구로 무슨 체질은 무슨 음식이 맞느니 안 맞느니 하는데 그것을 감별할 필요가 있겠는가(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모든 음식은 약성이 있으므로). 그것을 감별하여 지키는 일보다 인간이 가공한 음식들(인스턴트 음식 일체, 양식한 음식물, 백설탕, 조미료, 다시다, 봉지에 든 음식, 깡통에 든 음식, 식용유, 토마토케첩, 마요네즈, 방부제가 첨가된 모든 음식)을 감별하여 먹지 않는 것이 필요한 일일 것이다.
건강의 기본은 마음을 편히 먹는 것
건강을 지키는 일은 간단하다. 법정 전염병 이외에 건강을 지키려고 또는 와병 중에 건강을 회복하려고 노력할 때도 마찬가지다. 제일 중요하고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기본이다.
그렇다면 기본은 무엇인가? 마음 편히 먹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루하루가 감사한 날인 줄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맛있게 먹는가, 소화는 잘 되는가, 배설은 좋은가(소변, 대변, 땀, 침, 콧물, 눈물), 잠은 충분히 잘 자는가, 운동은 조금씩 하는가이다. 그 외에 마음을 잘 다스려 평정을 유지하고 분을 품지 않아 화냄이 없으면 그것이 모든 병의 근원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편집부
<저작권자 ⓒ 한국역사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